

검색 결과
'하다' 대한 검색결과 (도서 412권 독후감 1,298건)
-
-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
- 모리스 클라인관련독후감 3건
-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시작해 현대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단순한 기능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자취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 책은 20세기 삶과 사고를 형성한 수학의 역사를 유클리드, 뉴턴, 상대성 이론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
- 수학의 탄생 (이집트부터 그리스까지 시대를 초월한 수학적 사고방식의 비밀을 추적하다)
- 피터 S. 루드만관련독후감 1건
- 『수학의 탄생』은 고대인들의 수학적 사고방식을 추적하는 책이다. '수학의 유년기'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부터 그리스까지 고대인들의 수학적 사고방식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수학적 관습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본다. 그림과 표를 배치하여,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
- 순간이 묻고 생각이 답하다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작은 깨달음)
- 박희재관련독후감 1건
- 비범함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삶 나다움으로,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을 만나다! 어른, 문득 깨닫다 창문을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온전한 나로 살고 있습니까?”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시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백정이나 상여꾼은 사람이 아니었고, 노비는 부모의 성이 아니라 주인의 성을 따라야 했다. 천민이 괄시를 받던 시대, 그들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바랄 수 없었다. 아니, 바라지도 않았다. 묵은 관념이 만든 허울에 묶여 좀더 나은 삶을 바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분 제도가 사라진 지 100년 한참 전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운가? 만약 삶에서 자유롭다고 답하는 당신들이 있다면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부분 우리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의든 타의든 갖가지 올가미에 걸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그것이 삶이라고, 말한다면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이대로 살아야 할까? 온전하게 나로 생각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나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까? 『순간이 묻고 생각이 답하다』는 그대로 살아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한다. 온전하게 나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벽 안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 벽이 언제든 열 수 있는 창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가상의 벽 앞에서 생각과 행동을 멈춘다. 이제 우리는 이 벽을 창문으로 인식해야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비범한 순간들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다. 여기서 온전한 나로 사는 것은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나다움’은 자신을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
-
- 숫자, 의학을 지배하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제약산업의 사회사)
- 제러미 A. 그린관련독후감 1건
- 병이 약을 만든 게 아니라, 약이 병을 만들었다? 약은 질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의학사와 과학사회학의 눈으로 보는 숫자가 지배하는 의료산업, 나아가 ‘숫자의 시대’가 된 현대사회에 대한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 제러미 A. 그린의 진단! 오늘날 약과 질병, 위험과 진단, 의학과 시장의 복잡한 연계는 주류 의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리잡은 구조다. 반세기 전 미국만 돌이켜 봐도, 질병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약은 거의 없었고, 만성병은 대체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퇴행 현상으로 여겨졌다. 어쩌다 우리는 정상과 병리 사이의 구분선이 수치적 추상이 된 상황에 이르렀을까? 이러한 증상 없는 질병들은 어떻게 등장했으며, 건강과 질병, 의사와 환자, 개인과 인구집단 사이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약이 질병의 정의와 건강 증진의 철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데 어떤 힘들이 작용했는가? 이 책은 세 가지 약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약을 통한 예방’이라는 현대의학의 교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종합적인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
- 슈퍼제너럴리스트 (지성을 연마하다)
- 다사카 히로시관련독후감 2건
- 재빨리 정확한 답을 내놓는 능력이고, ‘지성’이란 ‘답이 없는 물음’에 대해 그 물음을 계속 되묻는 능력이다. [슈퍼제너럴리스트]는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만으로 ‘지혜’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래도록 꾸준히 경험을 쌓아서 깊은 ‘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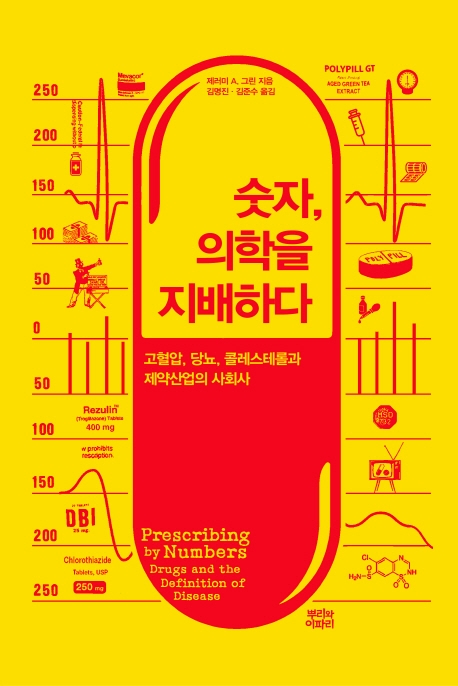

 이전10개
이전10개
